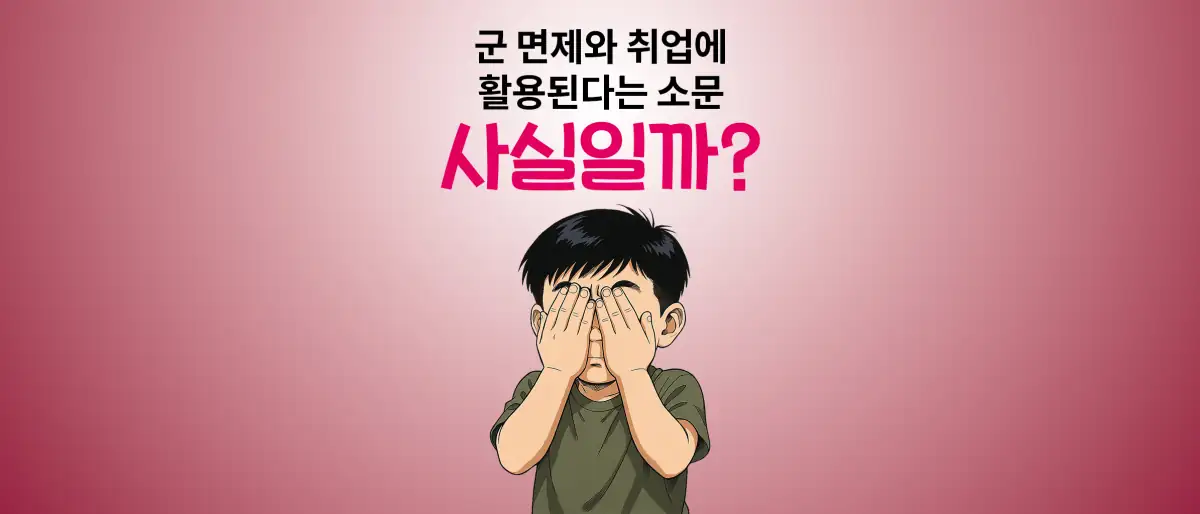
최근 강남3구를 중심으로 어린이 우울증 진단이 급증하고, 동시에 ‘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의 폐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와 별개로, 일부 부모들이 자녀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의도적으로 쌓아 군 면제나 취업에 활용하려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는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정신과 진료 기록, 군 면제에 활용된다는 소문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 일각에서는 “군 면제 혜택을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가 자녀를 정신과에 데려가 꾸준히 진료 기록을 남긴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쌓인 기록으로 성인이 되어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이를 통해 군 면제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심지어 “이런 방법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 취업 시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소문도 퍼져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며 “회사 팀장이 자신의 아들을 이런 방식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보냈다”고 밝히는 경험담도 종종 등장합니다.
실제로 가능한가? 병역 면제와 진료 기록의 관계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병역 면제는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시근로역(사실상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인원 중 10명 중 7명이 정신질환 사유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신질환을 가장하거나 진료 기록만 쌓아 면제를 노린다”는 시도가 여전히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에 따르면, 실제로 6개월 이상 꾸준히 진료를 받고 기록이 남아 있다면 병역 면제를 위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증상을 과장하거나, 입대 후 자해·자살 시도까지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엄격한 심사와 추가 검증, 그리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 제출이나 거짓 진술이 적발될 경우, 병역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취업에 정말 유리할까? 오히려 불이익 가능성
정신질환 병역 면제자가 대기업이나 공기업 취업에 유리하다는 소문도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병적증명서에 ‘정신질환’ 등 면제 사유가 기재된 경우 채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즉, 정신과 진료 기록이 오히려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도 존재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 면제를 받은 뒤 취업하거나, 진단서 조작이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전담 의료진과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진단의 신뢰성을 높이고, 허위 진단이나 병역기피 시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각의 소문, 현실은 복잡하다
- 일부 부모가 자녀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의도적으로 쌓아 군 면제나 취업에 활용하려 한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 병역 면제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허위 진단이나 병역기피 시도는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 오히려 정신질환 병역 면제 기록은 취업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진단과 병역 면제, 그리고 취업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병역제도의 신뢰성과 사회적 공정성을 위해 제도적 감시와 투명한 심사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진료 기록만 쌓으면 군 면제·취업이 쉽다”는 소문에 휘둘리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