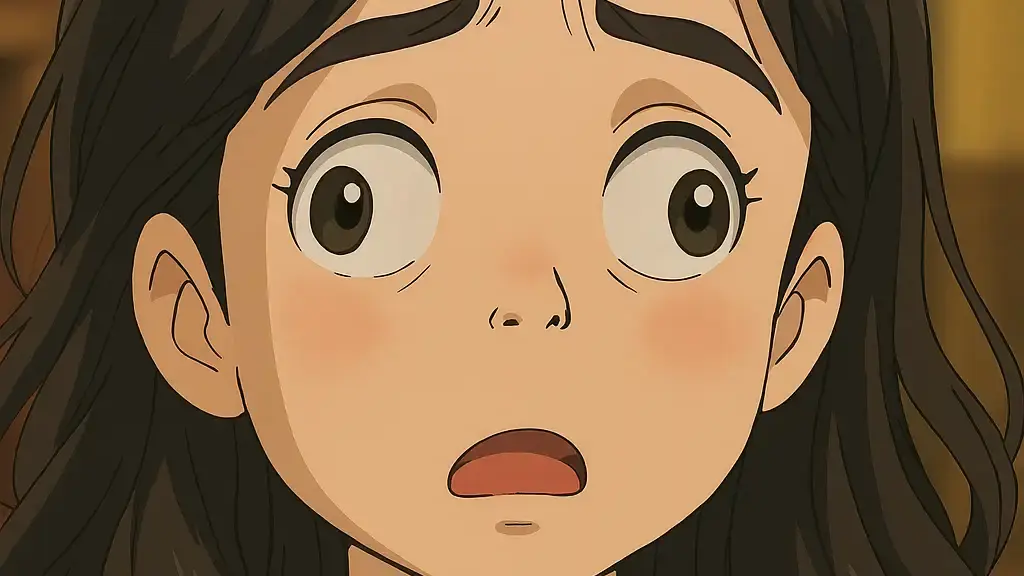
선의의 칼날과 무례의 창날 사이에서 점혈을 찾는 한국형 사회생활 심폐소생술
착함과 싸가지의 역설적 공존을 경험한 이들이 외치는 ‘장단에 맞춰 죽을래, 내 박자로 살래?
1. 선의의 이중주
지하철 출근길, 흔들리는 손잡이에 매달린 노신사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앉으시겠습니까?” 물으며 몸을 비켰을 때 의자에 털썩 주저않던 분이 내리는 역에서 투덜대는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요즘 젊은것들, 늙은이를 가엽게 보는 눈빛이 더 치사해.” 다음 날 같은 시간대에 고개를 돌린 채 서 있자 옆자리에서 중년 남성이 혀를 차더군요. “예의 교육도 제대로 안 됐나 보지.”
카페 테이블 위에 떨어진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며 웃었을 땐 “뭔 속셈이냐”는 의심 섞인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반면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운 학생이 경찰서에 맡기자고 제안했을 땐 “그냥 내버려 둘 걸”이라는 친구의 핀잔이 따랐죠. 선의의 빛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순간들이었습니다.
2. 호혜의 미로
동창생 생일 파티에서 일곱 시간 동안 준비한 수제 케이크를 건넸을 때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정도면 다음 달 내 생일엔 최소 호텔 뷔페는 기대할 수 있겠네?” 그 다음 해, 바쁜 일정 속에 간단한 화분을 선물하자 SNS에 ‘시간이 없으면 차라리 오지 말지’라는 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점심값을 대신 내준 지 삼 일 만에 “오늘은 네가 사야지”라고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모습에서, 인간관계의 저울추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은혜가 월급날까지 이어지는 채무 관계로 변질되는 사회적 풍경 속에서, 호의의 적정선을 찾는 일이 고된 수행처럼 느껴졌습니다.
3. 결정의 광장
프로젝트 회의실에서의 경험이 뇌리를 스칩니다. “자료 분석을 두 달 더 해보자”는 제안에 팀장이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그날, 다음 주 회의에선 신속한 실행 계획을 제출했더니 “성급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치 시계추가 좌우로 흔들리며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았죠.
이사 결정을 놓고 가족회의를 열었을 때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를 반복하던 아버지는 일주일 후 “주택가격이 오르기 전에 서둘러야 했다”며 한탄하셨습니다. 모든 선택의 갈림길에서 반대편 길의 풍경이 언제나 더 푸르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4. 연애의 속도계
첫 데이트에서의 실수가 아직도 몸서리칩니다. 삼일 동안 연락을 참으며 ‘조급함을 숨기려’ 했더니 상대방이 ‘관심 없는 줄 알고’ 다른 만남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음 소개팅에선 진도 조절을 시도했지만, 식사 후 공원 산책을 제안했을 때 “너무 느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맥이 풀렸죠.
영화 속 클라이맥스 장면처럼 키스 타이밍을 재던 그날 밤, 상대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러다가 결혼식 장면까지 스킵하는 거 아냐?” 농담 섞인 말에 당황해 웃음을 터뜨렸지만, 속으로는 관계의 속도계가 부서진 자동차 계기판처럼 느껴졌습니다.
5. 조직생활의 수수께끼
신입사원 시절의 한 에피소드가 떠오릅니다. 인사팀장의 “궁금한 건 물어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열두 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작성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마자 “이미 입사한 사람이 왜 이리 불신하냐”는 핀잔에 얼굴이 화끈거렸죠.
육개장 냄새가 밴 점심시간, 동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새파란 놈이 조직에 적응이나 할까?” 그날 이후로는 질문 대신 관찰을, 의견 대신 침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 달 후 프로젝트 실패 시에는 “왜 미리 의견을 내지 않았냐”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6. 자기 악보의 창조
어느 가을 아침, 한 노인네의 말씀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며 중얼거리던 말이죠. “인생은 남의 곡에 맞춰 추는 춤이 아니라, 자기 발소리로 만드는 음악이야.”
그날부터 타인의 리듬에 맞추기보다 제 음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친절은 경계선을 긋고, 호의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며, 결정은 내부 컴퍼스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회의석상에선 “생각이 깊다”는 평가와 “우유부단하다”는 지적을 동시에 들을 각오를 했죠.
길거리 공연자의 드럼 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이제는 제 삶의 박자로 주변을 리드해나가려 합니다. 남들이 ‘지랄’이라 부르는 것들의 정체는 아마도 각자 다른 악기에서 나오는 음향의 충돌일 겁니다. 진정한 성인은 이 불협화음을 조화로 승화시킬 줄 아는 이가 아닐까요? 세상의 콘서트홀에서 나만의 심장박동을 스피커로 삼아 연주해봅니다.